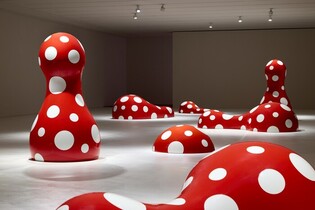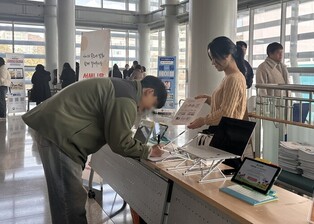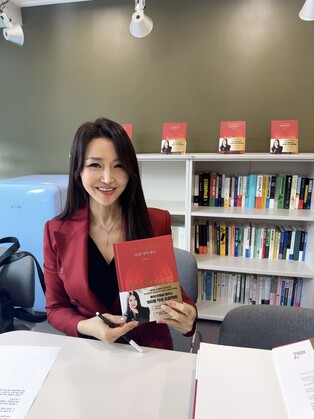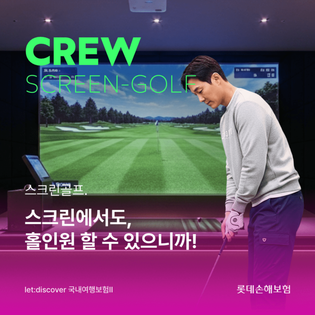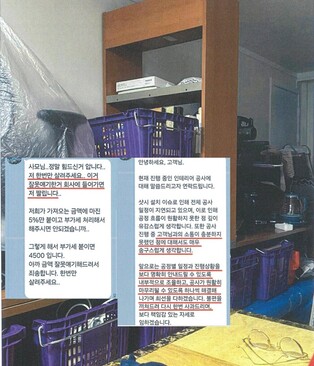지배적 사업자 '지정' 문제 난항...규제 수위 약화 전망
[메가경제=이준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업계 반발로 일보 후퇴하는 모양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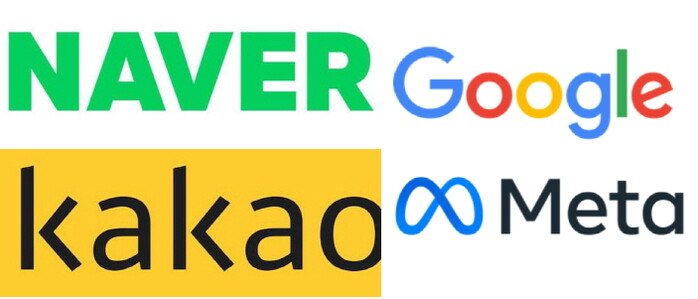 |
|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네이버, 구글, 메타, 카카오 CI. [이미지=각 사] |
공정위는 법안의 핵심이던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제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법의 골자는 매출 등을 기준으로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고,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반칙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주요 사업자와 관련 시장을 미리 확정하면 이들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나가기 전에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을 사전 지정해 옭아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외국 기업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 통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상의 역시 공정위의 플랫폼법 제정 추진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올 1월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를 공개하고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후 정부안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었다. 이르면 법 주요 내용을 정부안으로 설 명절 이전에 빠르게 발표하고 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계와 국회의 반대가 이어지자 발표 시점을 미루고, 전면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이 백지화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법 입법 계획 자체는 변함이 없다. 검토 결과 대안이 없다면 원안대로 사전 지정을 포함해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