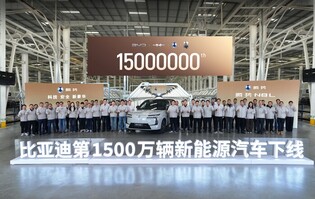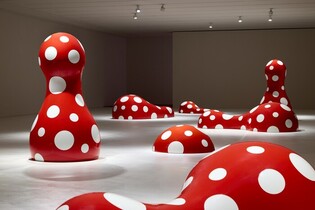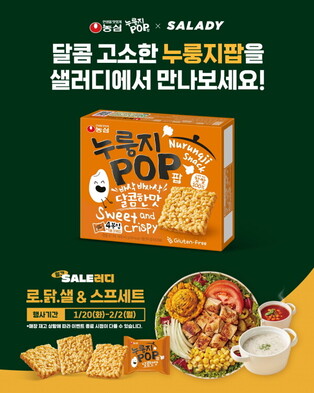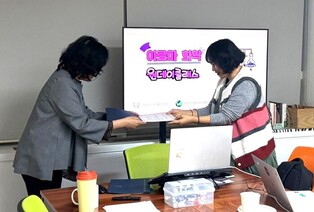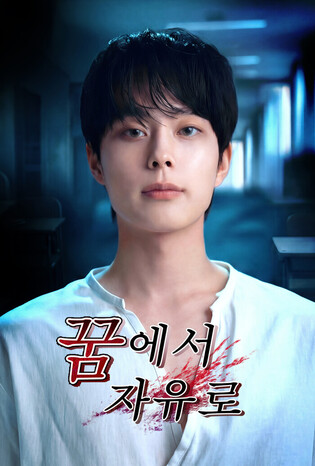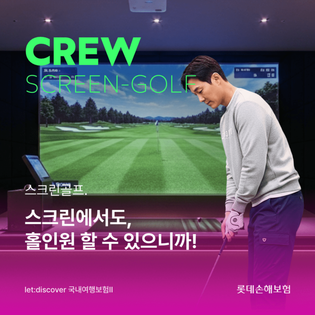[메가경제=황성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주요 전기부품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북미 주요 고객사 의존도가 높은 이들은 생산 거점을 미국·멕시코·베트남 등으로 다변화하며 리스크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 트럼프發 관세 폭탄 우려…업계 긴장 고조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8일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해당 관세에는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관세 관련 “200~300%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가 이미 예고한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반도체 업체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
| ▲삼성전기 수원 캠퍼스(왼쪽)·LG이노텍 마곡 사옥. [사진=메가경제] |
◆ 삼성전기·LG이노텍, 텍사스 공급망 가동 및 멕시코·베트남 증설
삼성전기·LG이노텍 등 국내 전자부품 업계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마트폰·PC 등 완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 가능성으로 부품 가격 인하 압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 부품업계는 과거에도 미국발 상호관세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삼성전기는 패키지 기판(FC-BGA)과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등 고부가가치 부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미국이 멕시코에 30% 관세를 예고하자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보류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멕시코는 협상으로 유예기간을 확보해 25% 관세를 적용받았다.
삼성전기는 향후 필요 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과 연계해 FC-BGA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요구에 발맞추면서 동시에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도 관세 정책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회사가 주요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베트남에도 46%의 관세 부과가 발표돼 비상이 걸렸지만, 이후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LG이노텍은 전장(자동차용 전자장치) 부품 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며 카메라 모듈 위주의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멕시코와 베트남 두 지역 공장 증설을 마무리한 만큼, 북미 고객사 의존도를 유지하면서도 관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갖췄다.
또, 지난 7월 미국 라이다(LiDAR) 기업 아에바 지분 6%를 인수하는데 최대 5000만달러(한화 약 685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거리 사물 센싱 기능을 고도화한 FMCW(주파수 변조 연속파) 기반 4D 라이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아에바와 손잡고 라이다 기술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
LG이노텍은 이번 증설을 통해 연간 카메라 모듈 생산 능력을 대폭 확대했으며, 향후 북미 외 인도·동남아 등 신흥 시장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관세 불확실성, 투자·가격 압박 변수로 작용
업계는 삼성전기·LG이노텍처럼 북미 고객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관세 정책 변화가 실적과 직결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관세 리스크를 기회로 삼아 공급망 재편과 시장 다변화에 성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는 단기적으로 국내 부품사들의 원가 부담을 키우고, 투자 계획에도 불확실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관세 회피를 위한 글로벌 생산지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