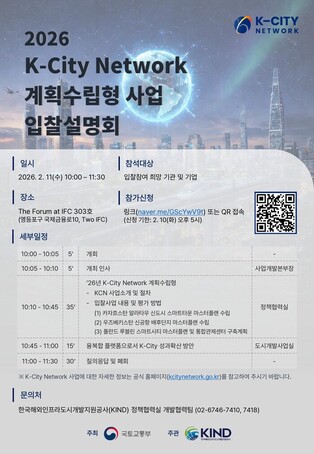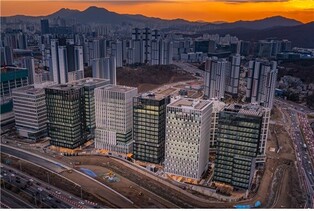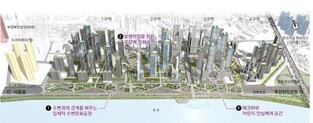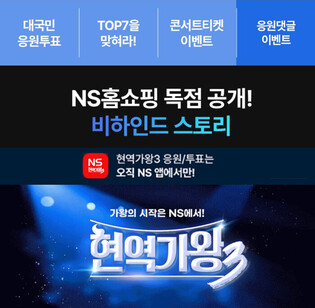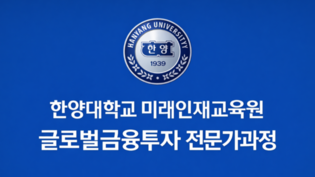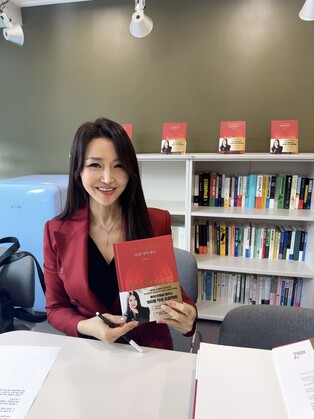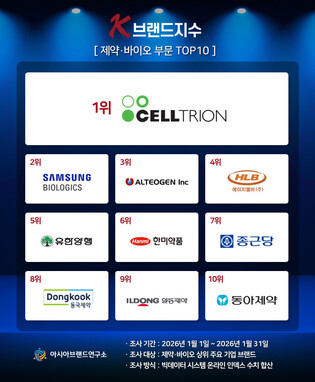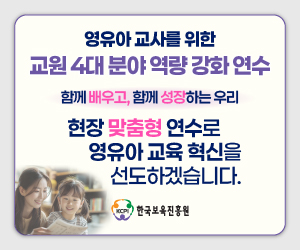[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결정을 철회했다. 여론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탄력근로제' 합의는 다시 무산됐다.
뉴스는 시대를 반영한다. 이들 키워드는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이슈의 정확한 뜻을 메가경제에서 풀이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311/p179565873458999_240.jpg)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일몰보다는 연장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통해 자영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년 12월에서 당해 연도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 탄력근로제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311/p179565873458999_686.jpg)
탄력근로제란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내에서 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개월 또는 연 단위를 설정한 뒤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가 많은 첫 주에는 58시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줄어든 다음주에는 46시간 일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 처분가능소득
![[일러스트 = 연합뉴스]](/news/data/20190311/p179565873458999_806.jpg)
50·60대의 소비성향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을 연령대별로 보면 39세 이하 가구는 70.2%를 기록했고, 40대 가구의 소비성향은 75.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50대 가구는 67.9%로 떨어졌고, 60대 이상 가구의 소비성향은 67.2%로 가장 낮았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뺀 것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이라고도 불리며 국민경제에 있어서 소득분배의 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며, 보통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 나라 경제 전체에 대해 사용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