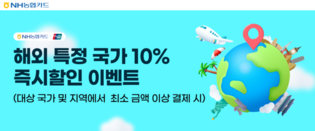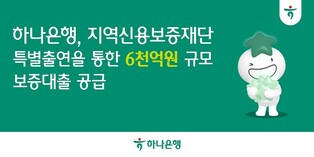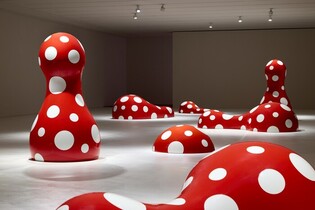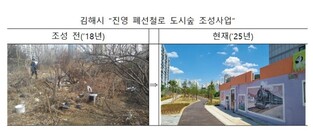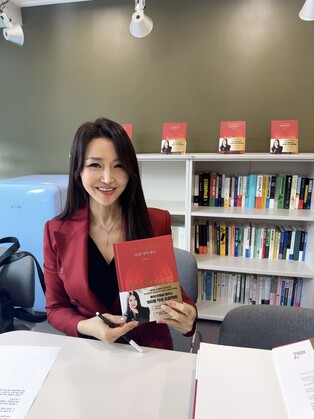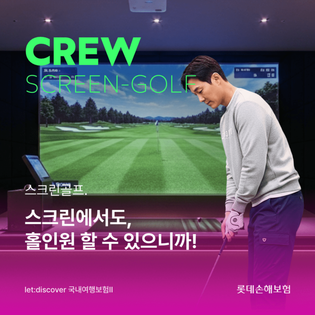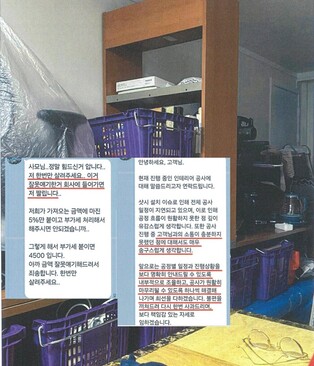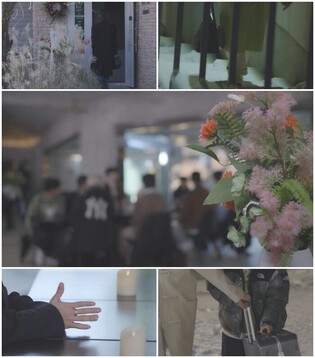[메가경제=이석호 기자] KT 전·현직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KT 전·현직 직원 69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
| ▲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원고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KT는 노동조합과 2015년부터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리는 대신에 56세부터 59세까지 매년 연봉의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노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 무효를 주장하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2019년과 2020년 소송을 냈다.
이에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영업손실 등 당시 경영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들이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또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에는 1300여 명이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수백 명이 포기해 699명만 항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옛 전자부품연구원)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았다며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이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