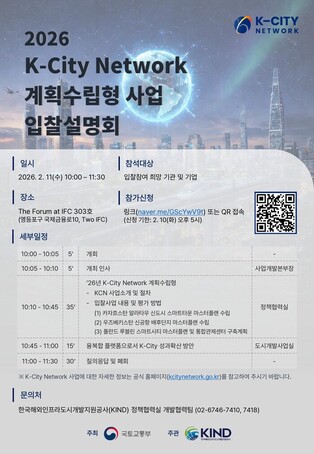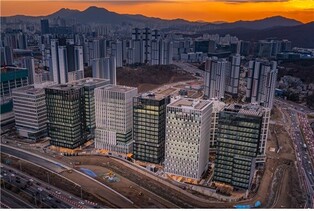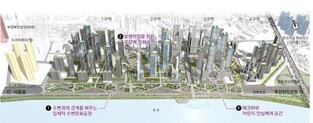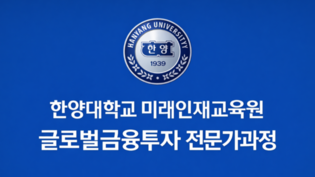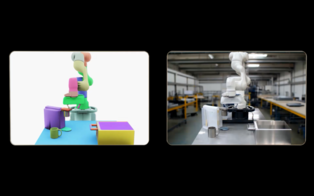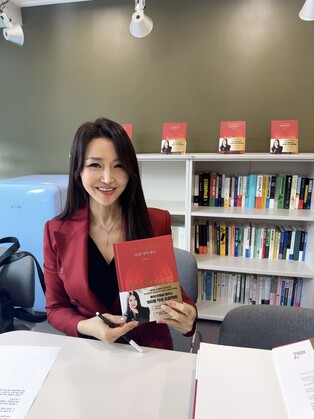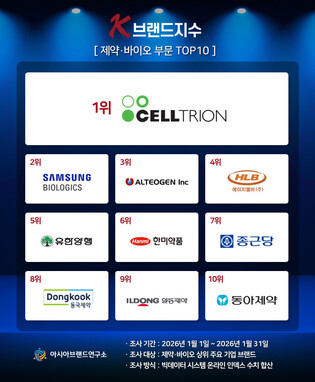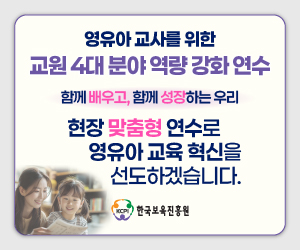[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의 고평가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주(3~7일)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주간 기준 3% 하락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상호관세 계획을 발표하면서 10% 급락했던 지난 4월 1주(3월 31일~4월 4일) 이후 최대 낙폭이다.
 |
| ▲[사진=연합뉴스] |
특히 대표적인 =AI 수혜주들이 ‘AI 거품론’에 휘말리며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가 11% 급락했고, 오라클(-9%), 엔비디아(-7%), 메타(-4%), 마이크로소프트(-4%) 등 주요 기술기업들도 동반 하락했다.
이들 종목을 포함한 AI 관련 상위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한 주 동안 약 8000억달러(약 1166조원) 증발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했던 엔비디아는 이번 한 주 동안 약 3500억달러(약 510조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AI 투자 열풍과 낙관적인 경기 전망 덕에 지난달 하순까지만 해도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AI 과잉 투자 논란이 재점화하고,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둔화 우려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가 역대 최장인 36일을 넘어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웠다.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소비심리 악화, 기업 감원 확대 등 악재가 겹치며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확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JP모건의 분석을 인용해 “평소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던 개인 투자자들마저 매수를 멈췄다”고 전했다. 팔란티어 등 일부 종목은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우위를 보였으며, 올해 급등했던 양자컴퓨팅 관련주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출회됐다.
롬바르드 오디에 자산운용의 플로리안 이엘포 거시경제 책임자는 FT에 “AI 관련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그 상당 부분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며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의 과열 투자 양상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