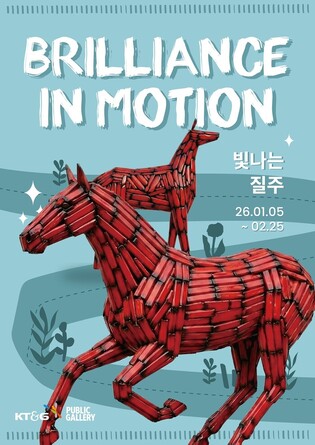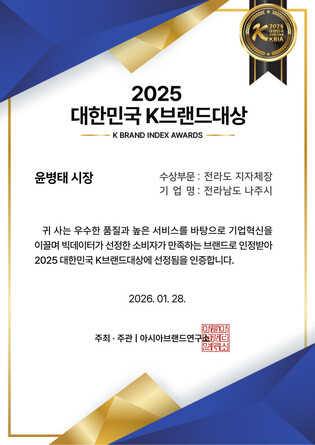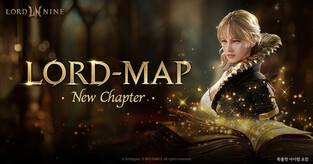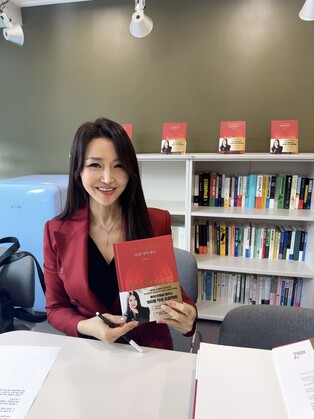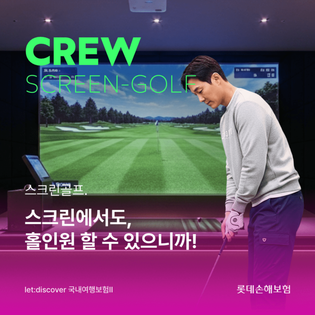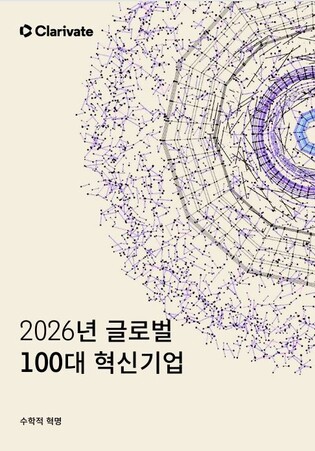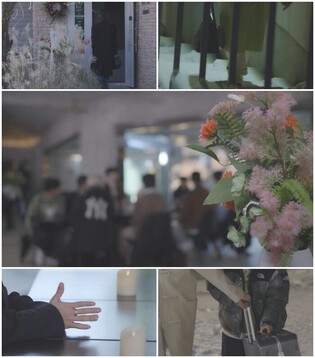이번 글에서는 오랫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피재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중단한 뒤부터 진단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도 고려하여야 한다. 근골격계질환은 업무에서 벗어나는 경우 상병의 진행이 더디어지거나 증상의 정도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 ▲ [사진=픽사베이 제공] |
자동차 공장에서 약 32년 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한 K씨는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다. 어깨에 무리가 갈 만한 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수개월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MRI 촬영 뒤 판독한 결과 K씨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퇴직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오랫동안 어깨에 무리가 갈 만한 업무를 한 것이 발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K씨의 최초요양에 대하여 승인 결정을 하였고, K씨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K씨가 퇴직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K씨의 상병이 ‘퇴행성’이었기 때문이다.
MRI 영상을 판독하였을 때, K씨의 좌측 어깨 부위에 손상이 누적되어 힘줄 파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퇴행성 상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환이기에 퇴직 뒤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K씨는 재직 중에도 어깨가 아파 보존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해당 기록은 퇴사 전부터 어깨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될 수 있다.
자동차 공장에서 K씨가 수행한 업무는 엔진, 트랜스미션, 엑셀러레이터, 컴프레서, 범퍼, 타이어 및 휠, 인판넬 등 자동차 부품을 각 자리에 맞게 끼워 넣고 조립하는 작업이다. 각 부품과 사용하는 공구(주로 임팩트렌치 등)의 무게가 적지 않았으며,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품은 어깨에 올리고 이동하였기에 부담이 되었다.
또한 각 부품은 각도를 맞춰 조립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구조상 좁은 공간에서 부품을 조립하여야 하기에 어깨를 돌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았다. 각도가 잘 맞지 않으면 힘을 준 상태로 밀어서 넣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도 어깨에 손상을 가한다.
이처럼 강도가 높은 업무를 32년이나 수행하였기에 K씨의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는 충분하였다. 위 사례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그 발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보려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신체부담의 정도, 업무를 중단한 뒤 진단일까지의 기간, 발병의 원인(사고성과 퇴행성의 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퇴직 후라도 근골격계질환을 진단받았다면 본인이 수행하였던 업무가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지에 대하여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곽은정 노무법인 한국산재보험연구원 노무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