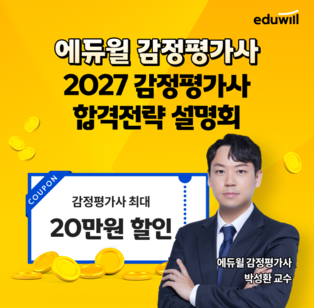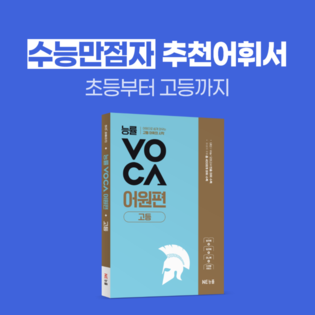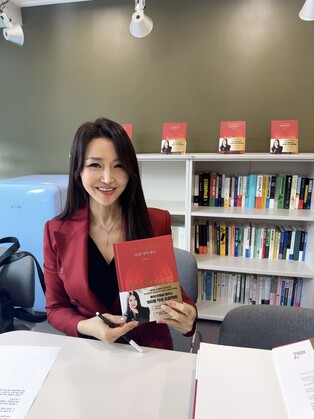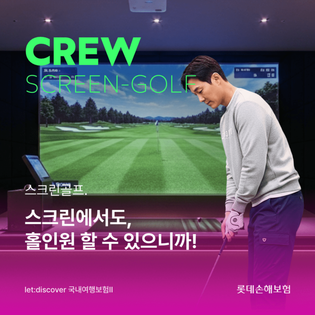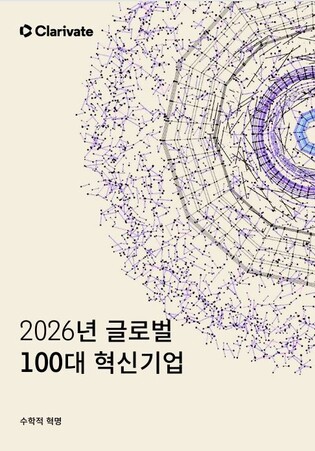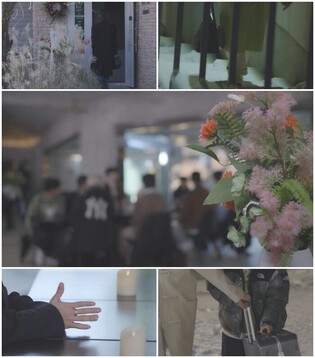|
| ▲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사진= AP/연합뉴스] |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현행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높여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연준은 16일(현지시간) 이틀 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현행 0.00~0.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금리를 1.00~1.25%에서 현재까지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FOMC는 은행들의 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0.10%에서 0.15%로 올렸다. 또 하루짜리 레포 금리도 0에서 0.05%로 인상했다.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과 관련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에는 변화가 없었다. 현재 연준은 매달 800억 달러(약 90조원) 규모의 미국 국채와 400억 달러 어치의 주택저당증권(MBS) 을 사들이고 있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상당한 추가 진전이 이뤄질 때까지 자산 매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백신 접종 진행으로 미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제에 있어 공공 보건 위기 여파를 지속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분명하게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 테이퍼링 문제를 논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논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테이퍼링은 '훨씬 이후'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금리인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점도표에서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다. FOMC 위원 18명 가운데 13명이 2023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중 대다수인 11명이 최소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점쳤다.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이날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265.66포인트(0.77%) 내려 3만4033.67,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22.88포인트(0.54%) 하락한 4223.70, 나스닥 지수도 33.17포인트(0.24%) 밀려 1만4039.68로 거래를 마쳤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