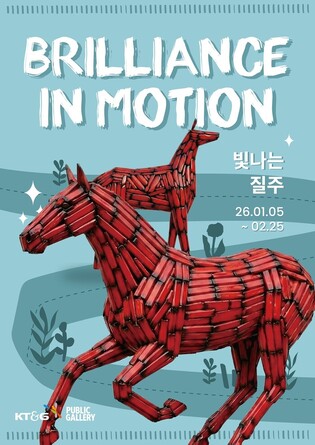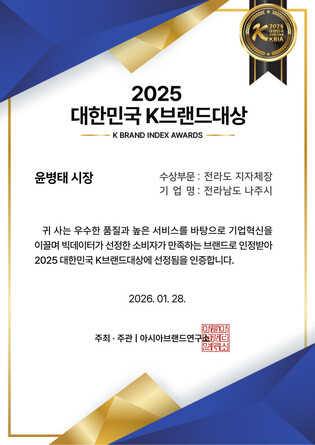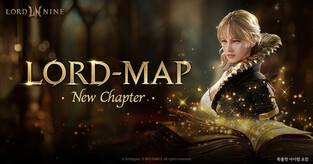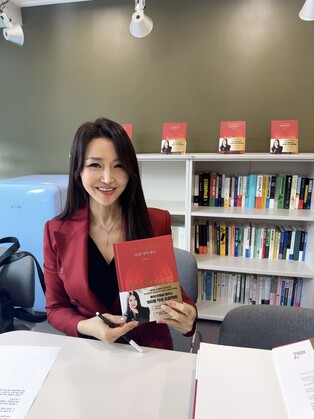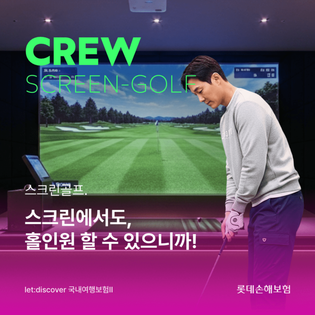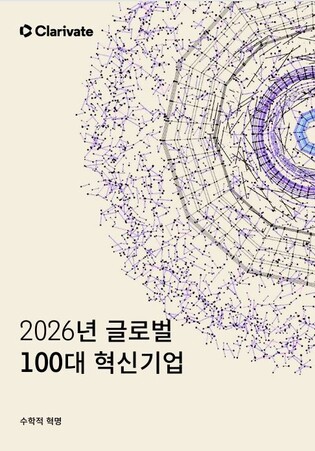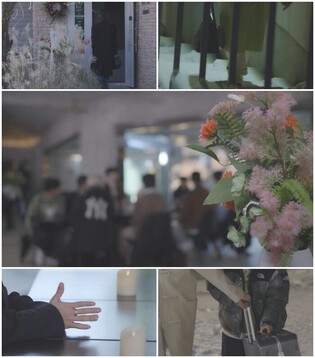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다른 산업재해 사건과 비교하여 인정기준이 복합한 만큼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급성·단기·만성과로로 분류하여 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판단요령으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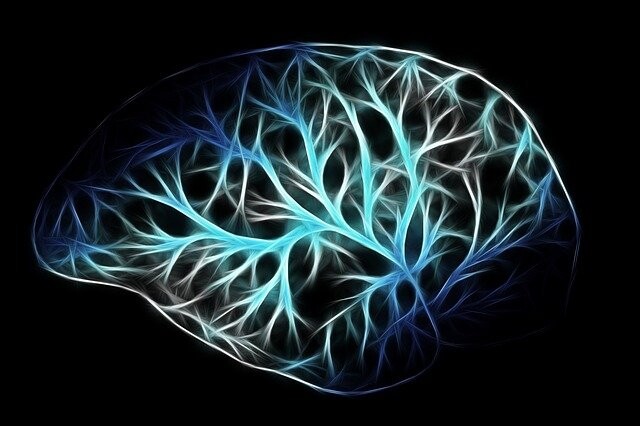 |
| ▲ [사진=픽사베이 제공] |
◆ 급성 과로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판단요령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이 명확하여야 하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 또는 사고의 목격, 사고 발생에 수반된 구조 활동이나 사고처리에 종사한 경우, 업무와 관련한 직장 상사·동료·고객과의 말다툼이나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급격한 부담을 느껴 24시간 내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단기 과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의미한다.
판단요령으로는 양적인 측면으로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업무량, 책임의 변화, 휴일 수,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증가이다.
예컨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동료 감소에 따른 개인 할당량이 늘어난 경우, 책임이나 특별 프로젝트에 수행으로 정신적 긴장이 동반된 경우, 근무형태에 있어 주간근무에서 교대제로 변화하거나 시차가 큰 외국으로 출장가면서 생체적 리듬이 바뀌는 등 육체적 부담이 가중된 경우, 온도변화가 큰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 있다.
◆ 만성 과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연관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한다.
뇌심혈관계질병에 근로자의 업무시간 산정은 필수적이며, 여기서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무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며,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뜻한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도록 되어있다.
만성과로 입증에 있어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매우 중요하다. 만성과로 사건에서 1주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인정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업무부담가중요인에는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➂ 휴일이 부족한 업무, ➃ 유해한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➄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이 있다.
끝으로 뇌심혈관계질병의 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업무시간이다. 뇌심혈관계 인정기준에 있어 기본적으로 12주 동안의 매일의 업무시간을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가족이나 동료의 업무시간 진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무시간 입증에 있어 근로자는 출퇴근일지나 작업일지, 컴퓨터로그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업무시간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산재 인정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노무법인 소망 박하빈 노무사]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